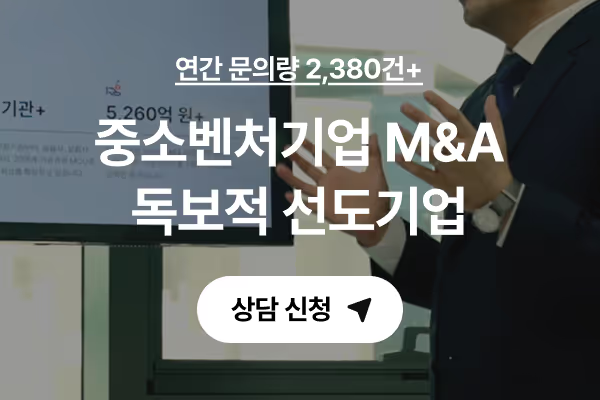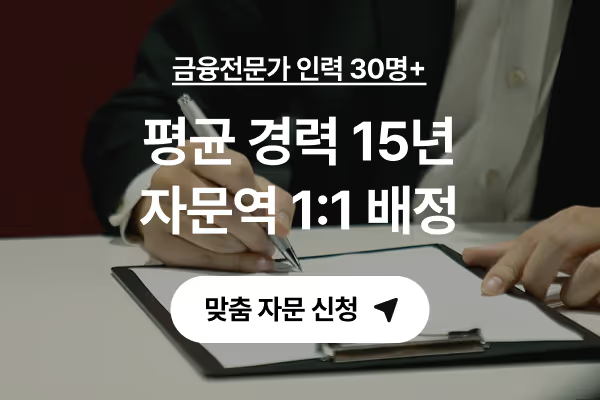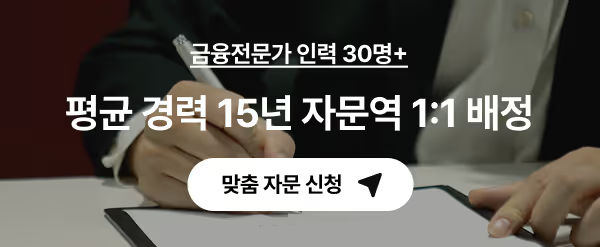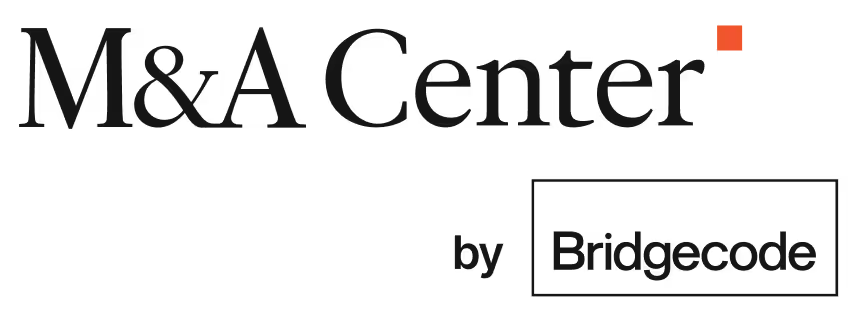중소·벤처기업 M&A 전문 자문사 브릿지코드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연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항목으로 ‘M&A 준비’를 지적했다. 매출 목표와 투자 계획, 조직 개편과 신사업 구상은 계획표에 포함되지만, 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구조 점검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번 기고는 브릿지코드 M&A센터 전략실장 김수정 상무가 집필했으며,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M&A 자문 현장에서 축적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년 계획 단계에서 점검돼야 할 M&A 준비의 본질을 다뤘다. 특히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인식과, 실제로 매각이 가능한 상태 사이의 간극이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로 드러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풀어냈다.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재무 성과만 놓고 보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이고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돼 있다. 그러나 인수자와의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거래가 쉽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거래 가능한 구조’로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신년 계획표에 던져야 할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 회사는 지금 매각 가능한 상태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점검하는 질문이다. 김수정 전략실장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 세 가지 지점이 함께 점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계약 구조다. 주요 거래 계약이 여전히 오너 개인 명의로 체결돼 있거나, 핵심 거래처와의 관계가 구두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M&A 국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곧바로 승계 불가능한 리스크로 평가된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거래 관계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매각 가능성을 가르는 기본 조건이다.
두 번째는 오너 의존도다. 중소기업 M&A에서 인수자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오너가 빠진 이후에도 회사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다. 주요 의사결정과 영업, 대외 관계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돼 있다면 이는 인수 이후 리스크로 인식된다. 핵심 인력의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노무·세무 영역에 남아 있는 관행적 리스크다. 미지급 수당이나 불명확한 인센티브 기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급여 체계는 실사 과정에서 단번에 협상 이슈로 전환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업계 관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일지라도, 인수자에게는 미래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실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나는 순간, 단순한 개선 과제가 아니라 거래 조건 악화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지는 불확실성으로 확대된. 가격 조정이나 조건 변경 요구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하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오랜 기간 누적된 준비 부족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수정 브릿지코드 M&A센터 전략실장은 “M&A는 특정 시점에 갑자기 결정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 여부가 누적된 결과”라며 “계약 구조 정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 내부 통제 강화는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선택지를 넓히는 준비”라고 말했다. 이어 “신년은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올해 매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언제든 매각 논의가 가능하도록 회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해럴드경제 기사 원문 보기
‘인수의향서(LOI)일 뿐’이라는 착각, M&A 협상을 흔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