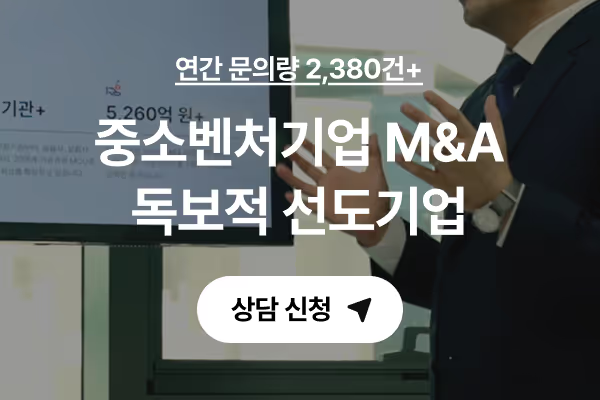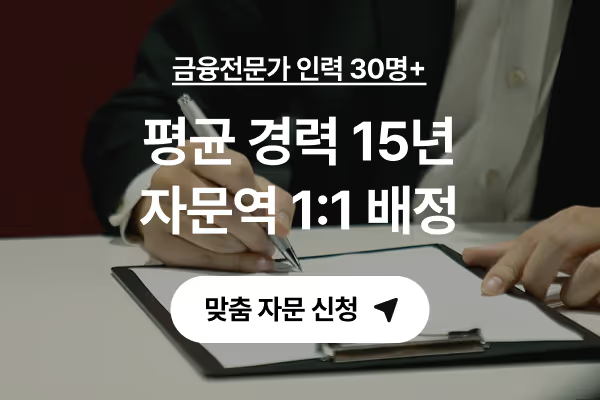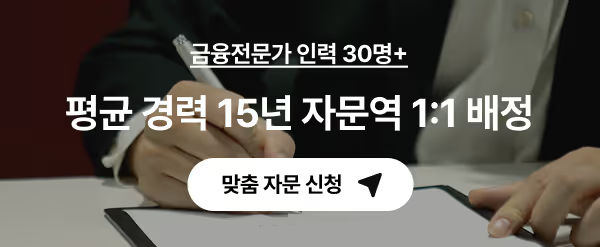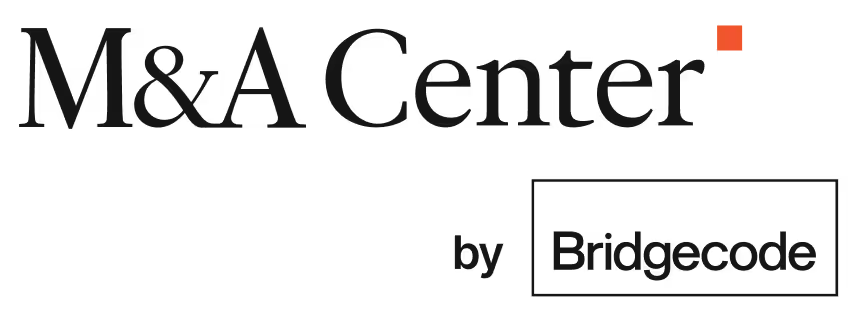"언어는 번역기가 통역해주지만, 비즈니스의 맥락은 누가 통역합니까?"
Intro.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
M&A 자문은 흔히 '무형의 서비스'라고 불린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없기에, 고객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심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특히나 그 상대가 바다 건너 외국 기업이라면 의심은 공포가 된다. 문화도, 법도, 일하는 방식도 다른 '미지의 영역'. 여기, 그 불확실성의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만난 브릿지코드 M&A센터 자문역들은 단순히 회사를 사고파는 중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는 비즈니스의 맥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글로벌 기업 '문엑스'와 한국의 뷰티덴탈 브랜드 '트렁크 코퍼레이션'의 딜을 성사시킨 그들의 치열했던 8개월간의 기록을 열어보았다.
Part 1. 문제 정의의 깊이가 다르다
이번 딜은 꽤 독특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트렁크 코퍼레이션)이 일본계 글로벌 기업(문엑스)에 인수되었어요. 보통 이런 '체급 차이'가 나는 딜은 성사되기 어렵지 않나요?
김대업 자문역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정의를 다르게 내렸습니다. 많은 자문사가 "얼마나 비싸게 팔아줄까?"에 집중할 때, 저희는 "왜 지금 이 만남이 필요한가?"라는 'Why'에 집중했죠.
김수정 자문역 : 저희는 킥오프(Kick-off) 단계에서 단순히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왜 지금 매각을 결심하셨습니까?", "매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창업자의 철학을 먼저 데이터화합니다.
철학을 데이터화한다니, 흥미로운데요.
김수정 자문역 : 그 과정에서 저희 시스템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포착했습니다. 대표님은 단순한 ‘EXIT’이 아니라, '브랜드의 더 큰 성장'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만든 브랜드가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딜 초기부터 과감하게 '언아웃(Earn-out)' 구조를 설계해 제안했습니다.
언아웃이라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김대업 자문역 : 맞습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팔고 떠나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조직 안에서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판을 짠 것이죠. 덕분에 매수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매도자는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협상 중에 우연히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업자의 니즈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브릿지코드의 시스템이 있었기에 애초에 설계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Part 2. 언어 너머의 문화를 번역하다
하지만 마음만 맞는다고 딜이 되진 않죠. 실제 협상 과정은 전쟁터였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글로벌 기업의 실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김대업 자문역 :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초대형 회계법인을 동원해 수백 개의 체크리스트를 들이밉니다. 작은 조직인 매도자가 이걸 감당하다 보면 본업이 마비될 정도죠.
여기서 저희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PMI(인수 후 통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미리 돌려보거든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다고요?
김수정 자문역 : 네. 상대방이 무엇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지,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할지 미리 예측하고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이번 딜에서도 국가 간 회계 기준 차이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재평가 및 세법의 차이 등 다양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안내가 있었기에 고객도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잘 넘어갈수 있었습니다.
'Cross-border(국경 간 거래)' 딜이니 소통 문제도 컸겠습니다.
김대업 자문역 : 단순히 일본어, 영어를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뉘앙스'의 싸움이죠. 예를 들어 한국 중소기업 특유의 '빠른 실행력'이 일본 대기업 눈에는 '절차 무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간에서 '문화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매수자의 차가운 지적을 매도자의 언어로 순화해서 전달하고, 반대로 매도자의 열정을 매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수치로 변환해서 전달했죠.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진정한 '번역'입니다.
Outro. 딜이 끝난 후, 진짜 시작되는 이야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자문역이 보여준 사진 한 장이 인상 깊었다. 도장을 찍고 난 후,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자문역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수많은 M&A 자문사들이 '숫자'와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하지만 브릿지코드 M&A센터는 ‘문제 정의의 깊이'를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믿음'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내 것처럼 파고드는 집요한 시스템에 있었다.
누군가에게 M&A는 비즈니스의 끝이지만, 브릿지코드에게는 기업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작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회사의 다음 챕터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들의 예리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